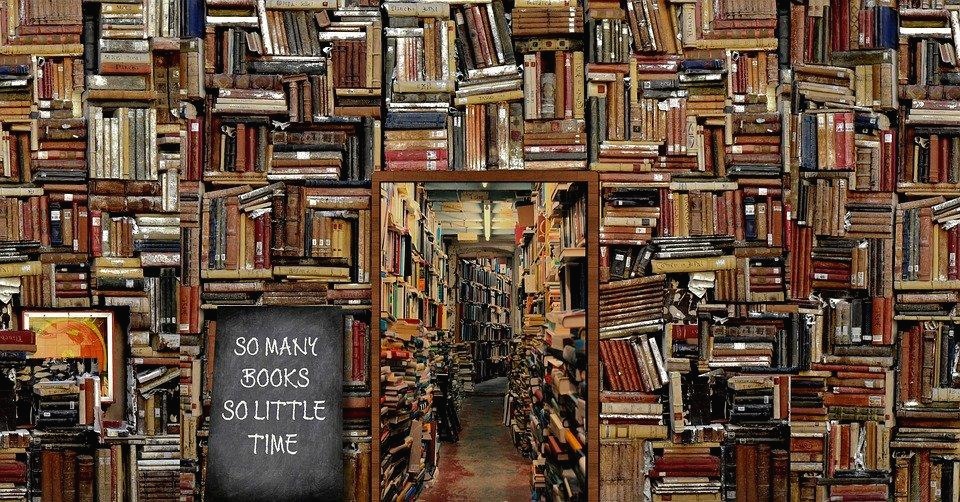한달 넘게 병원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김기동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어지러운 현관의 풍경을 스치듯 쳐다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는 신발 열댓 켤레가 마구 뒤섞여 놓여져 있었고, 한쪽 벽에 달린 신발장 문은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제 짝을 알 수 없는 신발들이 놓인 앞쪽으로 양파가 담긴 종이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맡았는지 못 맡았는지 집안으로 들락거리는 누구 하나 그 박스 안을 들여다 보지 않았다. 대낮 임에도 컴컴한 집안은 여기저기 수건과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집안으로 들어온 김기동은 국을 끓이느라 음식 냄새가 도는 집안의 어디라도 창문을 열거나 하려는 생각은 없는 듯,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방안을 둘러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시계를 쳐다보며 약 먹을 시간을 재던 기동은 약까지 다 먹고서야 비로소 집안을 천천히 둘러 다시 보았다. 그리고는 그간 쌓인 우편물 더미를 들추어 보던 김기동씨는 시청에서 보내온 안내문 하나를 들어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식탁의 절반 정도만 식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보였다. 고가의 인덕션 레인지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인덕션 레인지 위에도 여러 크기의 플라스틱 약통과 약 봉지, 무언가 담긴 그릇 등이 잔뜩 올려져 있어 이 인덕션 레인지의 용도가 그릇 받침대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
“엄마는 언제 온다고 하나?”
- “지금 오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좀 더 있다가 오시겠지요. 은숙이 보고 빨리 올라오라고 했는데, 오겠지요.”
“내 가방 안에 든 거 다 꺼내서 빨래 해야 된다. 빨래해서 다 널어놓고 가라.”
- “병원에서 빨래 안 해줍디까?”
-“해주지. 해주는데 어제 입은 옷하고 속옷은 안 빨고 그냥 들고 왔지.”
“제가 해놓고 갈 테니까 혹시 밖에 못 널면 아버지가 좀 너는 것만 하세요.”
-“……”
환식은 김기동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식탁과 싱크대 사이에 서서 숟가락을 하나 들고 국솥에서 바로 국을 떠서 홀짝이며 먹었다. 그러더니 우럭 살 점 하나를 그릇에 담더니 그대로 서서 발라 먹기 시작했다. 또 주방 바닥에 놓여있는 전기 밥통 뚜껑을 열더니 국을 떠먹던 숟가락 그대로 밥을 떠서 먹으며 다시 국을 떠서 홀짝였다. 그러는 환식을 본 기동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다.
“뭐하나? 앉아서 먹어라! 그리고 숟가락 입에 댄 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쑤시지 마라.”
김기동은 서서 밥을 먹는 환식을 보더니 버럭 화를 내었다.
“밥은 다 먹었고요, 한 숟가락만 더 먹으고요. 이제 안 먹습니다. 숟가락 깨끗하게 닦아서 살짝 밥만 한 숟가락 떠 먹었고, 침 안 묻혔어요. 국은 이대로 또 끓이면 깨끗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 소리를 또 지르십니까? 소리 지르면 혈압이 확 올라 갑니다. 혈압도 안 좋은 사람이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까? 말로 해도 다 들립니다.”
“아, 니가 더럽게 하니까 고치라고 하는 말이야!”
유신애는 부엌 뒤 편에서 무언가 하다 들리는 큰 소리에 나와 환식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옆에서 잠시 지켜보던 유신애는 눈치를 살피며 말에 끼어 들었다.
-“당신, 밥 다 먹어 놓고… 모자라요?”
“아니, 맛이 있어서 한 숟가락만 더 먹을라고 했지.”
-“이제 그 숟가락 놓고 빨래 하라는 거 좀 보세요. 여기 내가 치울게요.“
“아 참, 아버지 저렇게 매일 소리 지르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
환식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신애는 설거지를 마치고 어지러운 식탁을 다시 한번 흘깃 보고는 작은 방 문을 슬며시 열어 보았다. 집이 비어 있던 것이 한 달 가까이 되어서 인지 온 집안에서 군내가 났다.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도 한 달은 되었을 것이나 바닥 이불 아래 전기매트의 코드를 찾아 꽂고는 신애는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잠이 들려던 신애는 핸드폰이 울려 전화를 받았다.
“ 나 여기 빨래방 왔는데 말리는 것까지 하려니까 만원은 드네. 그냥 집에서 해야겠다. 세탁기가 제대로 돌아는 가나 한번 보시오.”
-“빨래방에 갔다고요? 빨래는 가지고 갔어요?”
“아니, 세탁기 돌아가나 그거 좀 보라니까”
-“돌아가겠지요. 이 집은 뭐 빨래 안하고 살까 봐요.”
“빨래 안 한다. 다 손으로 빨고 한참을 안 빨아 입고 하지.”
-“당신이 와서 보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유신애는 부엌 뒤 편의 어지러운 다용도실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났는지 인상을 쓰며 전화를 끊었다.
좀 전에 김기동의 식사를 차려주고는 부엌 뒤 편으로 갔던 유신애는 더러운 바닥과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를 쳐다보며 정리라도 하려는 듯 보였으나 다시 무언가를 찾는 듯 보였다. 장독을 보며 다가간 유신애는 뚜껑을 열며 안에 든 어떤 내용물을 찾는 듯 보였다. 다시 주방으로가 찬장을 열어보던 유신애는 새 비닐 봉지 몇 장을 찾아 꺼내어 들고 다시 다용도실로 갔다. 거기서 한 장독 뚜껑을 열어 된장을 조금 비닐 봉지에 퍼 담았다. 서너 개의 장독 뚜껑을 전부 열어 확인해 보고는 된장을 담은 비닐만 챙겨서 돌아 나왔다.
다용도실 바닥에는 채소 찌꺼기와 먼지, 머리카락이 뒤엉켜 쓰레기장 같았고 그 안을 들어갔다 나왔던 유신애의 발바닥은 엉망이 되었다. 그때 마침 큰 소리가 나 문 앞에서 멈칫한 것이었다.
그 다용도실 한 켠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통돌이 세탁기의 뚜껑은 떨어져 덜렁 거렸고, 세탁기 안에도 무언가 한참 담겨있었던 듯 보였다. 그래도 벽에 코드를 꽂으니 전원이 들어왔고 작동은 되는 듯 보였다.
신애가 다시 작은 방으로 가서 누워 있는데, 그때 환식이 돌아왔다.
“왔어요? 세탁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돌리고 우리는 이제 가야되요. ”
-“그래? 세제는 다 있나?”
“그거는 안 봤는데, 어디 있겠죠. 빨래를 하고 살면 세제가 어디에라도 있을 거에요.”
-“이 집에는 없을 수도 있다. 빨래 해놓고 저녁 차려드리고 내려가야지”
“저녁은 국 데워서 드리면 되고, 밥은 있어요. 차려만 놓으면 아버님 드실 수 있을 거에요.”
-“다 차려드리고 가야지. 은숙이 오늘 언제 올 줄 알고?”
“아까 당신이 일찍 가자고 했잖아요. 이제서야 저녁까지 다 차리고 간다고 해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
환식은 신애에게 통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기동이 누워 있는 방 문을 열었다.
“아버지, 정부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 간다고 돈 쓰라고 정부에서 집집마다 백 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백만원?”
자는 듯 보였던 기동은 눈을 번쩍 뜨고는 일어나 환식을 쳐다보며 말했다.
“네, 4명 가족이 백만원이고, 이 집은 지금 가구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이가 별로 가구 입니까?”
-“은숙이 별도다. 엄마랑 내랑 두 명 한 가구 다.”
“그러면 60만원 나올 겁니다.”
-“두 명은 60만원 주나?”
“네, 어무이 것도 아버지가 받으니까 받으면 어무이 30만원 드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생신 못 차려 드린 거 40만원 입니다. ”
-“명식이도 보냈나?”
“명식이 것이랑 합친 겁니다. 아까 미하 오마이가 우럭 장봐서 상 차려 드리고 또 저녁에 저녁 차려드리고 우리 는 내려갈랍니다.”
-“빨래는 했나?”
“빨래 이제 돌리고 널고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주무세요.”
“……”
'[단편소설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소설 김기동씨 화나셨어 9 (0) | 2020.10.19 |
|---|---|
| 코로나소설 김기동씨 화나셨어 8 (0) | 2020.10.19 |
| 코로나소설 김기동씨 화나셨어 6 (0) | 2020.10.19 |
| 코로나소설 김기동씨 화나셨어 5 (0) | 2020.10.19 |
| 코로나소설 김기동씨 화나셨어 4 (0) | 2020.10.19 |